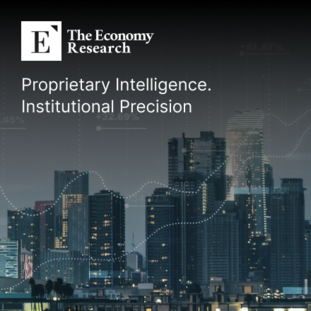“숨어 있는 2,700억 달러 꺼낼 때” 아르헨티나, 벼랑 끝 내수 부양 실험
입력
수정
내수 소비 얼어붙은 아르헨티나
미신고 달러 자산 유통 목표
페소 평가절하, 정책 지속성 우려

수백조원 규모의 달러 현금을 ‘침대 밑’에 숨겨놓은 국민을 상대로 아르헨티나 정부가 다시 한번 내수 소비 부양을 위한 승부수를 던졌다. 지난 한 차례 성공 경험이 있었던 ‘은닉 외화 양성화’ 유인 정책을 재도입해 자산의 시중 유통을 촉진하겠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국제통화기금(IMF)차관 의존과 고물가·환율 불안 상황 속에서 국민 신뢰 확보가 쉽지 않은 만큼 이번 정책은 단순한 캠페인이 아닌 국가 생존을 건 ‘마지막 카드’가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자산 은닉 그만, 지갑 열어라” 정부 메시지
11일(현지시각) 페르필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을 위시한 아르헨티나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에 자국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미신고 자산을 의미하는 ‘침대 밑 달러’의 할용 방안 발표할 방침이다. 침대 밑 달러란 표현은 과거 일부 아르헨티나인이 현금 달러를 침대 매트리스 아래 숨기던 것에서 유래했다. 최근에는 현지 은행 대여 금고 속 자산, 해외 조세 회피처의 프라이빗 뱅킹 계좌 내 자산 등 모든 미신고 현금자산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된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현재 자국 내 미신고 달러 보유 규모가 2,712억 달러(379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수십년간 경제 위기를 지속적으로 겪어 온 탓에 자국 화폐인 아르헨티나페소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하락해 있다는 진단이다. 특히 부동산 등 대규모 자산은 달러 거래가 일상화한 만큼 그 규모는 막대할 것이란 분석이다.
이번 조치를 두고 현지 매체들은 외환보유고 증대에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해석했다. 침대 밑 달러가 시중에 풀리면, 유통량 증가로 달러화 대비 아르헨티나페소 환율이 현재 시행되는 수준보단 훨씬 높아지고, 이는 물가상승률 억제에 도움이 될 것이란 설명이다. 페르필은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밀레이 정부가 침대 밑 달러까지 필요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당장 내년에 상환해야 할 외채 규모가 250억 달러(약 35조원)에 달하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반면 아르헨티나 정부는 보다 단순한 이유를 들었다. 루이스 카푸토 아르헨티나 경제장관은 “이번 조치를 통해 침대 밑 달러가 수면으로 올라오면 부동산과 자동차, 전자기기 등의 구매가 활성화되면서 내수 소비 진작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채 상환을 위한다는 일각의 해석을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당장의 활용 방안에 더 큰 역점을 두고 있는 셈이다.

제도적 뒷받침 + 심리적 완화 전략 병행
이번 아르헨티나 정부의 내수 부양책이 침대 밑 달러에 초점을 맞춘 배경에는 불과 1년 전 비슷한 시도에서 거둔 성과가 자리하고 있다. 당시 아르헨티나 정부는 최대 10만 달러(약 1억4,000만원)의 자산을 비과세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한 자산에 대해서는 향후 5년간 낮은 세율의 재산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신고자들에게는 2038년까지 적용될 세율을 미리 고정할 수 있는 선택권도 부여했다.
해당 정책은 유의미한 성과를 거뒀다.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에 의하면 지난해 7월과 8월에만 각각 7억2,800만 달러(약 9,770억원)와 7억4,900만 달러(약 1조52억원)가 금융권으로 들어왔다. 이는 밀레이 대통령이 2023년 12월 임기를 시작한 후 7개월간 금융권으로 순유입된 달러가 불과 5억3,200만달러(약 7,139억원)에 그쳤다는 사실과 크게 비교된다.
변수로는 세금 문제가 거론된다. 아르헨티나에서는 지난 20년간 달러 세금 감면 정책이 4년에 한 번꼴로 시행됐는데, 이전 정부의 정책에 응했다가 ‘세금 폭탄’을 맞은 경험담이 속출하면서다. 일례로 2019년 집권한 좌파 ‘페론주의’는 기존 0.25%였던 연간 개인 재산세 최고 세율을 국내 자산 1.75%, 해외 자산 2.25%로 대폭 인상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앞서 자산을 신고했던 사람들은 더 큰 세금 폭탄을 떠안았다.
내수 부양 실패 시엔 ‘최후의 카드’도 무용지물
이 같은 회의론적 시각 속에서도 아르헨티나가 내수 회복을 위한 부양책이 절실한 이유는 단순한 경기 침체를 넘어 국가 재정의 위기 국면에 진입했기 때문이다. 이미 올해 초 아르헨티나 정부는 IMF와의 협상을 통해 200억 달러(약 28조원) 규모의 추가 차관을 요청한 상태다. 여기에 기존 부채 상환 압박이 가중되면서 외환 보유액 또한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 환율 방어를 위한 정책 여력이 전무한 상황에서 내수를 살릴 유일한 카드로 침대 밑 달러를 지목한 셈이다.
문제는 이 같은 부양책의 유효 기간이 길지 않다는 점이다. 아르헨티나의 물가 상승률은 해마다 두 자릿수를 거듭 중이며, 통화 평가절하 압력은 점점 커지는 중이다. 그간 밀레이 대통령은 “통화 평가절하는 절대로 없다”면서 이에 대해 언급하는 경제학자를 가리켜 “사기꾼”이라고 맹비난해 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환율을 점진적으로 올리는 외환 정책인 ‘크롤링페그제’를 포기하는 등 시장의 평가를 일부 수긍하는 쪽으로 태세를 전환하는 모습이다.
결국 아르헨티나 정부는 정책 효과가 나타나기 전까지 금융시장과 실물 경제의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과제를 떠안게 됐다. 국민 신뢰를 얻지 못한 상황에서 자산이 계속 잠겨 있게 되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가 경제의 디폴트(채무불이행) 리스크로 이어질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이 경우, 아르헨티나는 다시 IMF의 조건부 긴축 정책에 끌려다니는 과거의 ‘흑역사’를 되풀이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