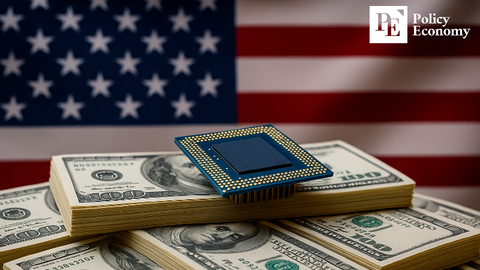입력
수정
美 정부, 보조금으로 반도체 기업들 지분 취득한다? 수에즈 위기 당시 이집트·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 연상되는 행보 "투자자 신뢰 무너진다" 국유화 후폭풍 유의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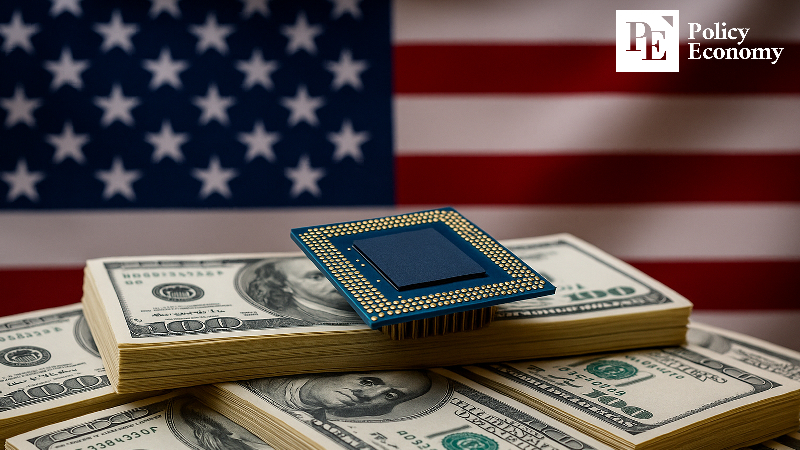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일제히 비상이 걸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시기 반도체지원법(CHIPS Act)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보조금을 지분으로 돌려받겠다고 선언하면서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미국 정부의 강경책에서 1950년대 벌어진 수에즈 위기,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이어진 러시아의 국유화 행보 등을 연상하고 있다.
美 반도체 보조금, 혜택 아닌 족쇄였다
19일(이하 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지원법 혜택을 받아 미국에 공장을 짓는 반도체 제조 기업들의 지분을 받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최근 미국 정부는 자국 반도체 제조 기업인 인텔에 109억 달러(약 15조2,500억원)를 지원하는 대신 지분 일부를 인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이 같은 조치가 대만 TSMC, 미국 마이크론, 한국 삼성전자 등 다른 기업에도 확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현재 미국 정부가 확보하고자 하는 인텔 지분은 10% 수준이다. 이는 현재 시가총액(1,107억 달러)과 보조금 지급 규모를 고려해 산출한 수치로 보인다. 여타 반도체 기업에도 동일한 계산식을 단순 적용할 경우 TSMC는 0.5%, 마이크론은 4.5%, 삼성전자는 1.5%, SK하이닉스는 0.3%의 지분을 미국 정부에 내줘야 한다. 이들 기업의 보조금 지급 규모는 △삼성전자 47억5,000만 달러(약 6조6,000억원) △마이크론 62억 달러(약 8조6,000억원) △TSMC 66억 달러(약 9조2,000억원) △SK하이닉스 4억5,800만 달러(약 6,700억원) 등이다.
이는 전례가 없을 정도로 무리한 요구이나, 트럼프 행정부는 해당 계획이 미국 납세자를 위한 것이라며 강행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날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의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한다"며 "왜 1,000억 달러 가치의 기업에 이런 돈(반도체지원법 보조금)을 줘야 하나, 미국 납세자들에게 어떤 이익이 있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우리는 바이든 행정부 때 약속한 돈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분을 확보할 것" 이라며 "미국 납세자를 위한 좋은 이익을 얻겠다"고 덧붙였다.
이집트 '국유화 정책'이 낳은 부작용
전문가들은 이 같은 미국 정부의 움직임이 1950년대 벌어졌던 '수에즈 위기'를 연상케 한다는 평을 내놓고 있다. 이집트에 위치한 수에즈 운하는 프랑스 기술자 페르디낭 드 레셉스에 의해 1869년 완성됐다. 당시 수에즈 운하의 지분은 프랑스 민간 투자자가 약 56%, 이집트 총독(헤디브 이스마일)이 약 44%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후 1875년 이집트가 파산 위기에 처하게 됐고, 영국은 그 틈을 타 이집트가 보유하고 있던 지분 44%를 취득했다. 프랑스와 수에즈 운하를 공동으로 소유하면서 운하 운영 수익의 대부분을 가져가게 된 것이다.
이에 1952년 쿠데타를 통해 이집트의 왕정을 폐지하고 정권을 잡은 가말 압델 나세르는 영국과 프랑스의 자산이었던 수에즈 운하를 일방적으로 국유화했다. 영국과 프랑스가 자국에 위치한 수에즈 운하 수익의 대부분을 가져가는 것은 제국주의의 산물이라고 주장, 이집트군을 움직여 수에즈 운하를 점거한 것이다. 이에 영국의 앤소니 이든 당시 수상은 즉시 프랑스·이스라엘과 함께 군사 대응에 나섰고, 손쉽게 수에즈 운하를 재점령했다.
그러나 영국과 프랑스의 개입은 국제 사회에서 제국주의적 행태로 인식됐다. 동맹국인 미국조차 영국과 프랑스에 경고를 보내고, 원유 공급 계획을 취소하는 등 제재를 가할 정도였다. 소련은 이집트를 돕기 위해 핵무기 사용을 암시하기도 했다. 결국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물러나야 했고, 나세르는 일약 아랍 민족주의의 영웅이자 아랍 세계를 휩쓴 혁명의 지도자가 되었다.
이후 나세르 정권은 1957년부터 외국 소유 기업의 국유화를 시작했고, 1960~1961년에 걸쳐 은행·보험·대형 산업 등을 전면적으로 국유화했다. 문제는 이 같은 행보가 이집트의 '환영 정책(외국인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 국유화 위험을 배제하고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국가적 신호)'에 대한 의심을 키우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다는 점이다. 이집트의 국유화 정책은 주권 수호의 상징이지만, 동시에 자본 유입의 제약을 불러온 악수이기도 했던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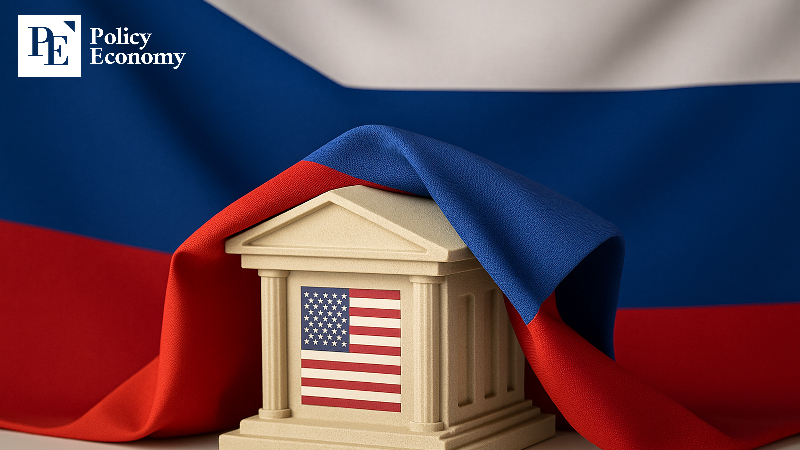
국유화 남발한 러시아도 '역풍'
최근 들어서는 러시아도 국유화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2022년 러시아 정부 소관위원회는 러시아를 떠나는 외국 기업 자산을 국유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의 골자는 비우호국 출신 외국인 지분이 25% 이상인 기업이 러시아 내에서 활동을 중지할 경우 이 기업의 외부 법정 관리를 허용하는 것이다. 외부 법정 관리는 외국 기업의 러시아 시장 철수를 막기 위한 절차로, 법원 지정을 통한 부실기업의 관리와 유사한 성격을 띤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법안이 사실상 외국 지배 기업에 대한 경영 통제를 가져오기 위한 국유화의 '기반'이라는 비판이 쏟아져 나왔다.
해당 법안은 2023년 4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에서 비우호국과 관련된 외국 자산을 임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명령을 내리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 자산을 대거 압류하자, 외국 자산 국유화를 통해 보복에 나선 것이다. 외부 관리 조치가 본격화함에 따라 덴마크 맥주기업 칼스버그 그룹이 소유한 발티카, 독일 가스판매업체 유니퍼의 러시아 자회사 유니프로, 유니퍼의 모기업인 핀란드 포르툼의 일부 지분 등이 러시아 국유재산관리청의 임시 관리를 받게 됐다.
최근에는 러시아의 임시 관리를 받던 기업이 실제로 국유화되는 사태도 벌어졌다. 지난 7월 러시아 법원은 미국인 소유 통조림 식품 회사 글랍프로둑트의 자산을 러시아 국가 소유로 이전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수개월간 이어진 법정 공방 끝에 나온 결정으로, 러시아 검찰이 제기한 글랍프로둑트 자산 국유화 청구가 전면 수용돼 즉시 효력이 발생했다. 글랍프로둑트는 러시아 최대 규모의 통조림 식품 제조업체로 창업자인 미국 국적의 레오니드 스미르노프가 자신이 설립한 미국 법인 유니버설 비버리지를 통해 소유하고 있었으나, 지난해 10월 러시아 정부의 임시 관리 체제에 편입됐다.
시장은 러시아의 이 같은 행보가 불러올 '역풍'에 주목하고 있다. 한 시장 전문가는 "러시아의 국유화 및 자산 압류 조치는 단기적 권력 강화에는 기여했을지도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거대한 리스크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향후 법적 분쟁, 국제 시장에서의 고립 등 악재가 꾸준히 누적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투자자들은 러시아 시장에서 언제든 재산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불안을 안게 됐다”며 “이런 불안이 해소되지 않는 한 러시아는 외국 자본을 다시 끌어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