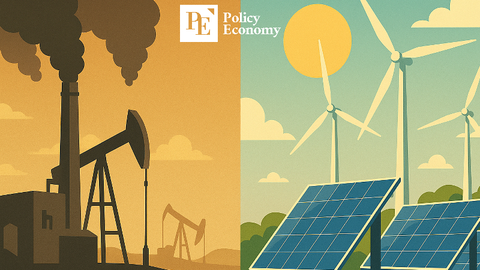[동아시아포럼] 갈등 키우는 세계 무역 질서 재편
입력
수정
미중 갈등 속 각국의 선택은 ‘공급망 다변화’ ‘프렌드쇼어링’과 산업 정책 촉발 지역 위주 공급망 재편, 지정학적 갈등과 보호무역 심화 가능성
[동아시아포럼] 섹션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대학(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에 대한 연구·분석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 이코노미(Policy Economy)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2018년 미중 무역 갈등 촉발 이후 많은 글로벌 제조 기업들이 중국을 넘어 공급망을 다변화해 왔다. 하지만 이미 제조 역량과 핵심 자원을 일부 국가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각국의 공급망 다변화는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 생산 및 공급망의 동맹국 이전)과 산업 정책(Industrial policy, 특정 산업 및 기업을 지원하는 정부의 전략)을 통한 정부 개입의 증가로 이어졌다. 문제는 이것이 이미 악화일로에 있는 전 세계의 지정학적 갈등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미중 갈등 속 각국 전략 ‘공급망 다변화’
2018년 미중 무역 갈등 초기만 해도 제조업체들은 공급업자 교체나 관세 회피를 위한 환적(transshipment) 등의 임시방편으로 대응했다. 갈등이 오래가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갈등은 내내 이어졌고 제조 기업들의 공급망 전략은 근본적인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었다.
경제 전문지 이코노미스트 임팩트(Economist Impact)의 ‘전환 무역 설문조사’(Trade in Transition surveys)에 따르면 2022~2023년 기간 글로벌 기업들의 공급망 전략은 다변화로 요약된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업체들 다수가 ‘중국+1’ 전략을 채택해 중국 이외 지역으로 사업 및 투자를 확장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 모든 것이 미중 갈등 때문은 아니겠지만 심각한 우려 사항으로 보는 것만은 틀림없다.
그렇다고 공급망 다변화가 매끄럽게 이뤄지는 과정은 아니다. 사업 소재지를 옮기는 결정은 상대국의 법치주의, 정치 안정, 분쟁 해결 가능성 등의 요소들을 모두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현실화하기까지 시간도 오래 걸린다. 독일 기업의 거의 절반이 핵심 광물을 비롯한 주요 중간재 공급을 중국에 의존하는 상황이 디커플링(decoupling)의 어려움을 대변한다. 미국 소비재 회사인 뉴웰 브랜드(Newell Brands)가 중국으로부터의 리쇼어링(reshoring, 생산 시설 국내 재이전)을 시도하지만, 중국 근처에도 못 미치는 북미의 생산 인프라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도 마찬가지다. 또 2017년 이후 지속된 미국 기업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중국 수입품은 미국 제조업 생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리스크 관리 위해 ‘프렌드쇼어링’으로
이렇게 지정학적 갈등 상황에서 다변화가 진행되다 보니 회사들이 리스크 관리를 위해 선택한 것이 프렌드쇼어링이다. 기업들이 기존 공급망 단계를 줄여 신뢰 가능한 네트워크 내에 남은 공급자들만 통합하는 전략을 의미하는데 2022년 10%에서 2023년 26%로 크게 늘었다.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이하 아세안)과 같은 지역 무역 연합이 반사 이익을 얻고 있다. 작년 아세안 국가들의 GDP 성장률은 4.7%로 세계 평균보다 1.5%P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45년까지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제거를 목표로 내건 역내 포괄적 경제 파트너십(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도 통합 공급망으로 진화해 동남아시아로의 리쇼어링을 촉진할 전망이다. 그중에서도 베트남은 전기차 및 전자제품 제조업 투자에 힘입어 최대 수혜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23년 미국-베트남 관계는 포괄적 전략적 파트너십(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으로 승격된 바 있다. 떠오르는 우방국으로서 베트남은 인공지능, 반도체, 친환경 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미국의 늘어나는 투자를 한껏 누리고 있다. 대미 수출 또한 미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제조 시설을 이전하면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베트남을 ‘비시장 국가’(non-market economy)로 유지하기로 한 미국의 결정은 양국 관계 개선에 방해 요소가 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은 물론 중국과도 우호적 무역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멕시코 역시 변화하는 글로벌 공급망 전략의 수혜자다. 중국 기업들 다수가 멕시코로 전략적 생산기지 이전을 단행하고 있는데,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exico–Canada Agreement)을 이용해 관세 장벽을 피하면서 미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다. 중국의 대멕시코 투자는 2018~2023년 기간 300% 증가했다.
지역 위주 무역 질서, 지정학적 갈등과 보호무역주의로
문제는 프렌드쇼어링이 일부 국가에 혜택을 제공하지만, 글로벌 무역 질서가 지역 위주로 재편될수록 지정학적 갈등은 더욱 악화한다는 것이다.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각국 정부의 무역 개입이 급증하고 있는 현실이 이를 증명한다.
미국이 주도하고 인도, 일본이 참여하는 광물 보안 파트너십 금융 네트워크(Minerals Security Partnership Finance Network)가 대표적인 사례다. 이는 친환경 에너지 생산에 필수적인 희토류 광물을 포함한 핵심 자원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궁극적으로 중국을 공급망에서 배제하려는 목적에서 설립됐다.
공급망을 무기화하는 현상은 기술 산업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현재 아시아권에서 생산 규모, 기술 수준, 투자 자본 등의 측면에서 대만의 TSMC를 대체할 업체는 사실상 없다. 대만과 일본, 미국 등 주요 기술 수출국들이 대만 해협 갈등 상황에서 중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당연하다. 트럼프(Trump) 미국 대통령의 중국, 캐나다, 멕시코에 대한 관세 부과 움직임도 마찬가지다. 해당 조치는 무역 전쟁을 촉발해 물가 상승과 세계 경제 불안정으로 이어질 것이다.
작년은 전 세계 40억의 인구가 투표에 참여한 해였는데 이에 따른 각국의 정치적 변화도 글로벌 사업 환경 및 무역 양상에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먼저 영국의 노동당 정부는 영국-EU 무역 관계 개선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중국산 배터리 전기차에 상계 관세(countervailing duty, 수출국의 부당 가격에 대응해 매기는 수입국의 차별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보호무역주의를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총리가 이끄는 인도 연립 정부도 보호무역 정책을 지속해 일부 산업에서 글로벌 공급망 통합을 어렵게 할 전망이다. 인도네시아는 일부 중국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해 프라보워 수비안토(Prabowo Subianto) 대통령의 중국 투자 유치 전략에 변화가 생겼음을 암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복귀와 함께 새롭게 구성된 각국 정부의 정책에 글로벌 공급망의 향방이 달려 있다.
원문의 저자는 아시 가르그 이코노미스트 임팩트(Economist Impact) 애널리스트 외 2명입니다. 영어 원문 기사는 Navigating supply chains in a fractured world | EAST ASIA FORUM에 게재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