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축미 방출에도 치솟는 일본 쌀값, 한국으로도 번지며 기후위기 ‘경고음’
입력
수정
비축미 방출에도 쌀값 급등세 지속
유통 비효율성이 가격 불안정 심화
한국도 수확량 감소에 농산물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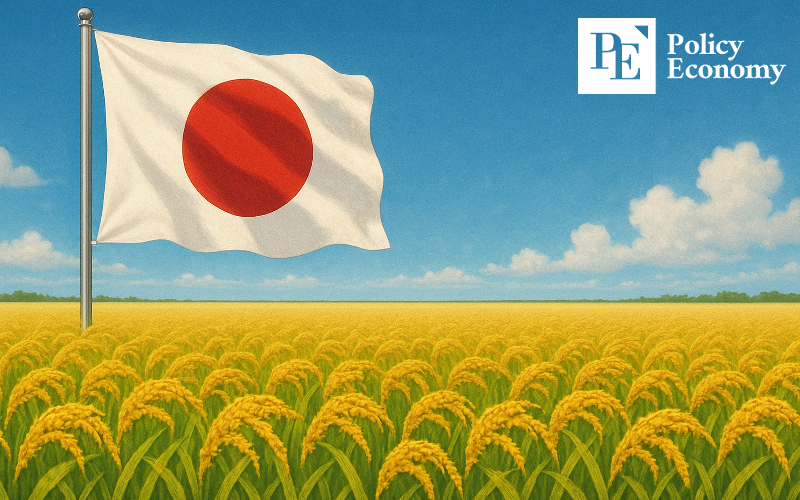
지난 여름 잠시 주춤했던 일본 내 쌀값이 2주 연속 오르며 가파른 상승세를 그렸다. 정부 비축미 방출로도 진정되지 않은 가격 불안은 한국에서도 고스란히 반복됐고, 한국 쌀값은 4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이에 단순한 유통 차질을 넘어 기후 변화로 인한 구조적 생산 위기가 한일 양국 모두의 밥상 물가를 압박하고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고품질 쌀 줄고, 가격은 ‘껑충’
15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이달 1∼7일 일본 전역 마트를 대상으로 조사한 쌀 소비자가는 5㎏ 기준 평균 4,155엔(약 3만9,22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주보다 6.8% 오른 수준으로, 일본 내 쌀값은 2주 연속 급등세를 그렸다. 매체는 “정부가 수의 계약으로 방출한 저가 비축미 유통량이 줄고, 고가 햅쌀이 판매되면서 평균 쌀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는 추세”라고 진단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올해 쌀 생산량이 전년 대비 56만 톤(t) 늘어나 쌀 부족 현상이 해소되고 가격도 안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장마가 이른 시점 종료되고, 가뭄에 따른 물 부족 현상이 심화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일본에서 재배되는 벼 품종은 대부분 고온에 취약하다. 이 때문에 쌀알이 희게 변하는 유백미가 크게 늘었고, 올해 일본 내 1등급 쌀의 비율은 80% 수준으로 떨어졌다.
주식인 쌀의 가격이 치솟으면서 소비자들은 식비 절약하에 허리띠를 졸라맸으며, 일부 식당은 스시나 덮밥 가격을 인상하기도 했다. 그 결과 일본의 8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월 대비 3.1% 상승했다. 이는 일본은행(BOJ) 목표치인 2%를 크게 웃도는 수치로, 쌀값 폭등이 전반적인 인플레이션 압박으로 이어짐을 의미한다.
이 같은 상황은 내달 4일로 예정된 자민당 총재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당초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상과 함께 유력 후보로 점쳐지던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의 당선 가능성에 적신호가 켜진 것이다. 그는 재임 초기 과감한 정부 비축미 방출로 국민 지지를 얻었지만, 그의 정책이 무위로 돌아갈 공산이 커지면서 선거 구도에도 변수가 될 것이란 분석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지난 13일 지지자 모임 직후 “당을 다시 하나로 묶어 야당과 맞서고, 국민이 가장 원하는 물가 대책 등을 해결하고 싶다”며 출마 의향을 밝혔다.
생산 차질에 유통 불안정까지 겹쳐
전문가들은 일본 내 쌀값 상승은 단순한 시장 일시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요인이 겹쳐진 결과라고 입을 모았다. 주요 원인으로는 먼저 유통의 불안정성이 꼽힌다. 일부 업자가 모내기도 끝나지 않은 단계에서 매입 계약을 서두르며 시장 혼란을 키웠고, 정부가 방출한 비축미도 수의계약 물량이 줄면서 가격 안정 효과를 내지 못했다는 진단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는 일시적 소비 확대와 사재기 현상이 겹치면서 소매 가격이 왜곡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유통 문제만으로는 설명이 충분치 않다. 이 때문에 생산 기반 자체가 약화된 점이 근본 원인으로 지목된다. 일본의 벼 재배면적은 1970년대 300만 헥타르(㏊)에서 2024년 124만 ㏊까지 줄었다. 여기에 농가의 고령화도 심각하다. 농업센서스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일본 쌀 농가 경영주 평균 연령은 71세에 달하며, 후계자 부재로 은퇴 농가 또한 빠르게 늘고 있다. 생산 기반이 취약해진 상황에서 정부의 감산 정책이 장기간 이어지며 공급 여력이 위축됐다는 지적이 가능해진다.
여기에 기후 변수까지 악재로 작용했다. 앞서 언급했듯 일본 벼 품종은 냉해에는 비교적 강하지만, 고온에는 취약하다. 대표 품종인 ‘고시히카리’가 특히 그렇다. 폭염과 장마 조기 종료로 인해 일본 쌀 수확량은 예년 평균 700만 톤(t)에서 올해 약 660만~670만 t으로 5%가량 줄었다. 여기에 품질 저하 문제도 심각해 1등급 쌀 비율까지 줄었다. 이처럼 유통의 비효율성과 기후 위기로 인한 생산 차질이 동시에 나타나면서 일본의 쌀값 급등은 단순한 시장 불안을 넘어 구조적 문제로 인식되는 상황이다.

한일 동시 쌀값 불안, 기후 리스크로 확산
우리나라의 상황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한국 또한 쌀 소비가 빠르게 감소하면서 2000년대 초부터 쌀 생산조정제 등 감산 기조의 정책을 펼쳐 왔다. 그 결과 이달 5일 기준 국내 산지 쌀값은 20㎏당 5만5,810원으로 4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했다. 소매가격도 20㎏ 평균 6만1,000원을 돌파하며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20% 이상 뛰었다. 이에 시장에선 “일본처럼 ‘쌀 대란’이 일어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커지는 양상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격 상승의 직접적 원인으로 조생종 수확기에 이어진 잦은 비를 지목했다. 이로 인해 출하가 늦어지면서 공급 부족이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기후 변수에 취약한 국내 쌀 생산 구조가 더 큰 원인이라는 분석도 힘을 얻는다. 일본 사례에서처럼 이상기후로 인한 작황 부진은 단순 유통 차질보다 더 근본적이며, 생산량 감소와 품질 저하를 동시에 유발한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쌀 공급 부족을 완화하기 위해 비축미를 연이어 방출하고 있다. 지난달 25일부터 이미 3만 t을 풀었지만, 2주 만에 절반이 소진되면서 나머지 물량 또한 이른 시일 내 동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농식품부는 추가 2만5,000t을 산지 유통업체에 대여하는 방식으로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13일 농식품부 유튜브 채널 라이브 방송에서 “늦어도 다음 달 중순부터는 본격적으로 햅쌀이 출하될 것”이라며 “쌀 소매가 또한 안정화에 접어들 전망”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