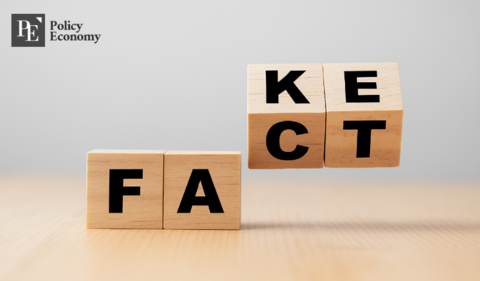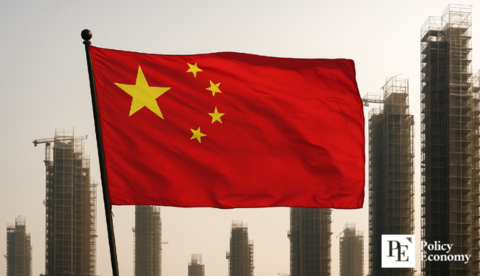입력
수정
韓, 2030년 국가부채 비율 59.2%까지 뛴다? 위기 속에서도 '재정 확장' 공약하는 대선 주자들 IMF "정부 부채, 경제 성장에 장기적 악영향"

올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비(非)기축통화국 평균치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선진 비기축통화국들이 줄줄이 부채 비율 축소에 힘을 쏟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이 같은 흐름을 본격적으로 '역행'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불어나는 정부 부채
11일 국제통화기금(IMF)이 발간한 4월 ‘재정점검보고서(Fiscal Monitor)’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54.5%로 예상된다. 이는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비기축통화국 11개국의 평균치(54.3%)를 처음으로 넘어서는 수치다. 일반정부 부채는 중앙·지방정부의 회계·기금 부채(D1)와 비영리 공공기관의 부채를 포함한 광의의 정부 채무로, IMF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국가 간 부채를 비교할 때 주요 지표로 활용된다.
이에 더해 IMF는 한국의 부채비율이 2030년 59.2%까지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여타 비기축통화국의 2030년 평균 전망치(53.9%)를 5%p 이상 웃도는 수준이다. 2025년 대비 증가폭은 4.7%p로, 비기축통화국 중에서는 체코(6.1%p)에 이어 두 번째로 크다.
반면 같은 기간 대부분의 선진 비기축통화국은 일반 정부부채 비율을 줄일 것으로 예측됐다. 뉴질랜드(-0.5%포인트)·덴마크(-1.2%포인트)·노르웨이(-2.7%포인트)·스웨덴(-2.8%포인트)·안도라(-3.4%포인트)·아이슬란드(-12.4%포인트) 등이 대표적이다.
부채 축소 대책 '묘연'
정부는 부채 부담을 줄이고 재정 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해 재정준칙(정부의 재정 지출과 수입을 관리하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칙) 법제화를 꾸준히 시도해 왔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22년 기준 OECD 38개 회원국 중 35개국이 하나 이상의 재정준칙을 시행하고 있다.
문제는 한국의 재정준칙 관련 논의가 10년째 공회전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6년 박근혜 정부가 처음으로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했지만, 탄핵 정국에 휩싸이면서 동력을 잃었다. 이후 문재인 정부 때는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을 위한 재정 지출이 확대되며 논의가 뒷전으로 밀렸다. 윤석열 정부는 취임 전부터 재정준칙 법제화를 공약했지만, 국회를 주도하는 더불어민주당이 “유연한 재정 운용을 방해한다”며 대립각을 세우고 탄핵 정국이 더해지면서 흐지부지됐다.
오는 6·3 대선에 출마하는 후보들은 재정 건전성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는커녕 재정 지출·조세 지출(감세) 확대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아동수당 대상 단계적 확대 △청년층 구직활동 지원금 상향 △지역화폐 적용 소득공제율 인상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종합소득세 산정 물가 연동제 도입 및 기본 공제액 확대 △법인세·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직장인 성과급 세액 감면 등을 약속했다.

나랏빚이 경제 옥죈다
이 같은 부채 확대 흐름은 향후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3월 IMF가 발간한 워킹페이퍼 '정부 부채와 성장: R&D의 역할'에 담긴 칸 세버(Can Sever) IMF 이코노미스트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높은 시기(중앙값 기준)의 산업 성장률은 평균 2.6%로 낮은 시기(3.2%)보다 0.6%p 낮았다.
산업별로 보면 연구개발(R&D) 집약도가 높은 산업의 성장률은 부채가 많을 때 2.8%로, 적을 때(3.9%)에 비해 1.1%p 더 낮았다. 반면 같은 조건하 R&D 집약도가 낮은 산업의 성장률은 각각 2.4%와 2.7%로, 그 차이가 0.3%p 수준에 불과했다. 정부부채가 많을수록 R&D 집약도가 높은 산업의 성장률이 더 크게 악화한다는 의미다. 이는 전반적인 R&D 집약도가 높은 우리나라에 있어 치명적인 악재다. 한국의 R&D 집약도는 2023년 기준 4.96%로 OECD 국가 중 2위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정부 차원의 대처가 절실한 때라고 입을 모은다. 한 시장 전문가는 "지난 몇 년간 반도체 산업 침체로 인해 국세 수입이 급격히 줄었는데, 정부는 딱히 지출 규모를 조정하지 않았다"며 "부채가 불어나는 것도 당연한 수순"이라고 짚었다. 이어 "불어난 정부부채는 경제에 장기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며 "매년 세수 펑크가 발생하는 상황에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씀씀이를 줄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