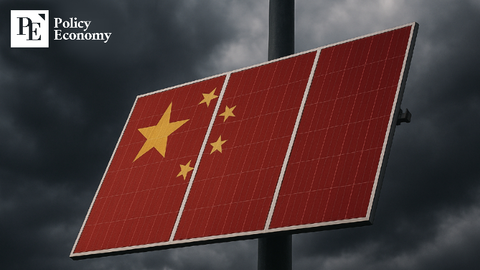입력
수정
WSJ "트럼프, 시진핑 중국 주석에게 선물 안겨" "손잡고 中 때리던 시절 끝났다" 갈라서는 서방 동맹 中, 美에 보복관세 부과하며 전면전 돌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촉발한 글로벌 무역 전쟁이 중국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서방 동맹의 결속력이 약화하며 중국이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미국의 이 같은 '악수'를 발판 삼아 무역 보복을 본격화, 미국과의 전면전을 선포하고 나섰다.
트럼프 관세 장벽에 中 '미소'
지난 4일(이하 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관세가 시진핑의 날을 만들었다’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글로벌 무역전쟁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전략적 선물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 미국의 관세 장벽으로 인해 함께 중국을 견제하던 서방 동맹에 균열이 생겼다는 것이다. 실제 3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미국의 대(對) 유럽연합(EU) 20% 상호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잔인하고 근거 없는 결정”이라며 프랑스 기업의 대미 투자를 당분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날 캐나다도 미국산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트럼프발(發) 관세 전쟁이 격화하면 중국의 기술 발전과 독자 생태계 구축에 오히려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미국의 관세 장벽이 높아질수록 중국 빅테크들의 기술 자립이 빨라질 수 있다는 얘기다. 아울러 관세 전쟁으로 인해 미국에 대한 반감이 커질 경우, 중국 소비자들 사이에서 ‘궈차오(애국소비)’ 유행이 본격화하며 중국 소비와 내수가 회복될 가능성도 있다.
중국이 관세 전쟁 속에서 개발도상국에 대한 영향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미국은 동남아시아 국가에도 높은 상호관세율을 적용했다. 베트남 46%, 태국 36%, 인도네시아 32% 등이다. 이 같은 관세 폭탄이 현실화하면 동남아 주요국들은 대미 수출 의존도를 낮출 수밖에 없고, 결국 중국이 반사이익을 누릴 가능성이 크다.
'보복관세'로 맞불 놓은 中
미국의 관세 장벽을 통해 유리한 입지를 점한 중국은 미국에 대한 보복 수위를 점차 높이고 있다. 지난 4일 오후 7시 중국 국무원은 중국 국영 채널인 CCTV방송을 통해 4월 10일부터 모든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34%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증시가 개장하기 불과 3시간 전에 기자회견이 아닌 일방향 소통 수단을 활용해 '맞불'을 놓은 것이다.
정부 차원의 비(非)관세 보복 조치도 대거 쏟아져 나왔다. 최근 중국 상무부는 세계무역기구(WTO)에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방침을 제소했다. 아울러 사마륨 등 7종의 희토류 관련 품목 수출을 통제하고, 스카이디오 등 11개 미국 기업을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목록'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기업은 중국과 관련된 수출입 활동에 종사할 수 없으며, 중국 내 신규 투자가 금지된다. 중국 세관 당국인 해관총서도 검역 문제가 제기된 미국 기업 6곳의 중국 수출 자격을 잠정 취소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전면전으로 치닫자 글로벌 시장 혼란은 가중되기 시작했다. 양국 간 보복전이 장기화할 경우 인플레이션 위험이 커지고 교역량이 줄어들며 글로벌 경기가 가라앉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리스크를 떠안게 된 미국 증시 역시 눈에 띄게 휘청이고 있다. 미국 S&P(스탠더드앤드푸어스)500지수는 지난 2일부터 4일 사이 10% 넘게 폭락했고, 같은 기간 뉴욕 증시에서 6조6,000억 달러(약 9,600조원)에 달하는 시가총액이 증발했다.

韓 '새우등' 터진다
한국 역시 미·중 관세 전쟁의 영향권에 들어있다. 중국은 한국 제조 기업의 주요 투자 대상국 중 하나다. 지난 2023년 말 기준 한국 제조업 해외투자 누계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31.6%(769억 달러)에 달했다. 중국에 자리를 잡고 미국에 제품을 수출하는 국내 기업들이 향후 미국의 관세 장벽으로 인해 줄줄이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의미다.
특히 기계·전자류 제품을 취급하는 기업들의 타격이 막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계·전자류는 미국 대중국 수입의 46.9%를 차지하는 품목이다. 관세 장벽이 현실화하면 중국에 기계·전자류 제품 제조 기지를 둔 한국 기업들은 물론, 국내 전기·전자 중간재 수출 기업들까지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중국산 자동차 부품과 배터리 소재 등을 수입하는 대미 투자 기업들도 막대한 비용 부담을 떠안게 된다. 관세로 인해 미국 시장으로 들어가지 못한 중국 제품들이 저가로 미국 이외의 시장에 쏟아져 나오면 공급망 전반의 혼란이 가중될 위험도 있다.
한국 기업이 중국 제품의 우회수출에 연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 시장 관계자는 "중국에서 사실상 완성된 제품을 한국에서 단순 가공하거나 포장만 바꿔 '한국산'으로 둔갑시킨 뒤 미국에 수출할 경우, 미국으로부터 우회수출 의심을 받을 위험이 있다"며 "중국산 핵심 부품 비중이 높은 경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지 못해 한국산으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