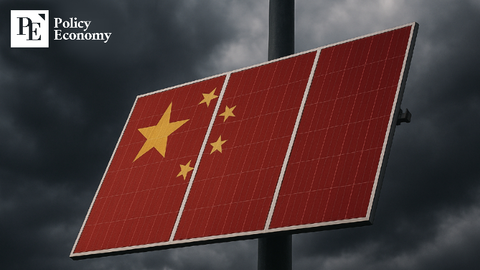입력
수정
미국, ‘해외 부패 방지법’ 존폐 갈림길 규제 준수로 ‘미국 기업 불리’ 주장 중국 부상과 함께 ‘글로벌 기업 윤리’ 영향
[동아시아포럼] 섹션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대학(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에 대한 연구·분석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 이코노미(Policy Economy)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트럼프(Trump) 행정부가 해외 부패 방지법(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FCPA, 이하 부패 방지법)을 개정하기로 한 것은 동남아시아 기업과 정부의 부패 관행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1980년대 이후 미국 기업들의 비즈니스 윤리 강화에 기여해 온 해당 법은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이 규제 완화를 시사하며 존폐의 갈림길에 섰다. 하필 지금은 중국의 글로벌 투자 영향력 확대로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미국의 기업 윤리 기준에 얽매이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 영향은 더 심각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 ‘해외 부패 방지법’ 개정 움직임
지난 2월 10일 트럼프 대통령은 부패 방지법의 적용을 6개월간 유예하고 실효성을 재검토하도록 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록히드 마틴, 걸프 오일, 노스럽, 모빌 등 미국 기업들의 뇌물 수수 의혹이 불거지며 1977년 발효된 부패 방지법은 미국 회사들의 해외 뇌물 수수 및 부패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해당 법은 수십 년간 기업들이 국제 관계를 다루는 법무 및 대정부 관계 팀을 신설하는 등 규제 준수 문화를 발전시키는 데 공헌해 왔다.
또한 해당 법은 수많은 규제 컨설팅 업체를 포함한 법무 법인은 물론 미국-아세안 비즈니스 협의회(U.S.-ASEAN Business Council) 및 미국 상공회의소(U.S. Chamber of Commerce)와 같은 비즈니스 협회의 출범으로도 이어졌다. 모두 해외 시장에서의 정치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들이다. 결국 부패 방지법은 부패를 사업 비용이 아닌 법적, 평판적 리스크로 재정의하도록 해 미국 기업의 해외 확장에 주춧돌 역할을 해 왔다.
해당 법 때문에 ‘미국 기업 불리’ 주장
하지만 트럼프의 주장은 이 법이 부패 문제가 만연한 핵심 광물 및 사회 기반 시설 등의 분야에서 미국 기업들을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한다는 것이다. 해당 법은 국회 동의 없이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없지만 당장의 집행력은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수십 년간 동남아 국가들은 미국 투자를 받기 위해 세계은행(World Bank) 및 국제통화기금(IMF), 유엔 등이 촉구하는 반부패 및 기업 윤리 제고를 반영한 경제 개혁을 추진해 왔다. 해외 직접 투자 유치를 위한 관료제 개혁이 대표적이다. 1986년에 시행된 베트남의 도이 머이(Doi Moi) 경제 개혁(중앙 계획 경제에서 시장 중심 경제로의 전환)과 인도네시아가 1960년대 버클리 마피아(Berkeley Mafia, 당시 버클리 대학교에서 교육받은 경제 관료들을 지칭하는 말) 주도하게 진행한 시장 지향적 개혁 등이 이에 해당한다.
미국 기업 해외 진출과 해당국 제도 개혁에 이바지
덕분에 미국 기업들은 리스크를 줄이며 이 지역에 진출할 수 있었다. 카길(Cargill)이 1995년 베트남에 진출한 후 2000년대 나이키가 뒤를 따랐고 인도네시아도 1965년 셰브런(Chevron)의 투자 확대 이후 80년대 코카콜라, 듀폰, 씨티은행의 진출이 이어졌다.
이에 동남아시아 정부들은 관료적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 경제 구역 설치로 화답했다. 말레이시아가 1972년 바얀 레파스 자유 산업 지역(Bayan Lepas Free Industrial Zone) 지정으로 인텔 및 AMD 등 반도체 기업 유치에 나서자 인도네시아는 셰브런과 프리포트-맥모란(Freeport-McMoRan) 등 미국 기업에 ‘우선적 지위’(priority status)를 부여하기도 했다.
하지만 반부패법으로 미국 기업들의 해외 진출은 도움을 받았지만 당사국의 제도적 개혁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부패 인식 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 순위를 보면 인도네시아가 99위, 베트남 88위, 필리핀 114위, 태국이 107위에 머물고 있다. 말레이시아가 57위로 가장 앞서지만 갈 길이 먼 것은 마찬가지다. 부패 방지법의 영향을 철저히 받는 미국 기업들과 달리 동남아시아 경쟁사들은 뇌물 및 정치권과의 유착을 포함한 비공식적 거래를 통해 규제를 피해 나가는 것이 엄연한 사실이다.
중국 영향력 확대와 맞물려 ‘전 세계 사업 관행에 영향’
글로벌 경제의 양상이 바뀐 영향도 크다. 미국 기업들이 글로벌 투자를 주도할 때는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미국의 기업 규제 조항을 준수하려는 경향이 강했다. 하지만 중국이 동남아 지역의 투자 환경을 뒤바꾸면서 상황은 달라지고 있다.
미국과 달리 중국의 규제 제도가 이제 만들어지는 상황이라 중국 기업들은 제약이 적고 융통성은 많다. 미국 기업들이 규제 준수 때문에 회피하는 사업성 높은 프로젝트를 얻어낼 가능성도 그만큼 크다. 예를 들어 중국의 칭산 홀딩스 그룹(Tsingshan Holding Group)은 인도네시아 정부와 정치적 유대가 강한 ‘PT 빈탕 델라판’(PT Bintang Delapan)과 합작해 니켈 가공 공장을 운영 중이다. 중국 기업에는 당연한 파트너십을 미국 회사는 피해 가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결국 트럼프의 반부패법 개정 시도는 중국 경제의 부상과 트럼프의 사업 철학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해당 법이 완화되면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미국 관련 규제 준수를 유지할 동기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이들 국가가 미국과 함께한 이유는 윤리적 가치가 아니라 경제적 이해였기 때문이다. 이제 사업상의 융통성을 제공하는 투자처로 더 자유롭게 옮겨갈 가능성이 크다.
이는 미국 기업도 마찬가지다. 그들 역시 규제에 덜 얽매인 해외 기업들과의 경쟁과 규제 준수의 이점을 비교 분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트럼프의 행정 명령이 단기간의 정책 변화로 끝날지, 해당 법의 철회로 이어질지는 알 수 없지만 전 세계 기업 투명성에 미칠 영향은 지대할 것으로 보인다.
원문의 저자는 아마드 샤리프(Ahmad Syarif) 존스 홉킨스 대학교(Johns Hopkins University) 박사과정생입니다. 영어 원문 기사는 US corporations and the politics of compliance in Southeast Asia | EAST ASIA FORUM에 게재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