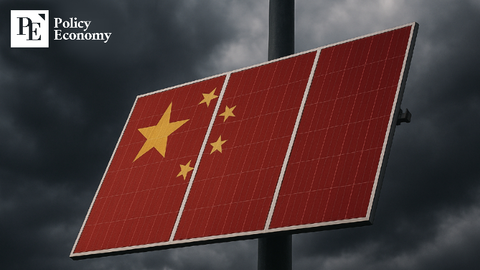입력
수정
외국인 박사 제적생 26%가 공학도
기업 60%는 외국 연구인력 채용 의사
인력 수급 불일치-취업난 악순환 반복

연구개발(R&D) 등 첨단 분야를 공부하기 위해 한국을 찾는 외국인 유학생의 증가세가 주춤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대로 학업을 중도 포기하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이공계 유학생은 늘어나는 추세다. 우수한 인재 확보가 산업 성장으로 직결되는 만큼 이들 이공계 유학생이 국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각종 지원책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국인 공학 박사 입학생 6년 새 1.2배 증가 그쳐
24일 한국직업능력연구원(직능연)에 따르면 2023년 국내 공학 계열 박사 과정 외국인 입학생은 91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6년(775명)과 비교해 1.2배(136명) 늘어난 수준이다. 같은 기간 사회 계열(경영·법학·정치·사회) 입학생이 439명에서 1,557명으로 3.5배, 예체능(연극·영화·음악·미술) 유학생이 212명에서 1,627명으로 7.7배 증가한 것과 대조적이다.
학위 과정을 중도 포기한 유학생도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2016년 138명이던 공학 계열 박사 과정 외국인 제적생은 2023년 208명으로 증가했다. 전체 박사 과정 외국인 제적생 중 공학 전공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6.6%로 모든 계열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행을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로는 경직된 비자 제도가 거론된다. 관련법에 따르면 외국인 유학생(D-2 비자)은 졸업 후 전문인력 비자인 E-7 또는 거주 비자인 F-2로 전환해야 합법적으로 국내에 체류할 수 있다. 하지만 2023년 D-2 유학생 15만2,094명 가운데 E-7 전환에 성공한 이는 576명으로 전환율이 0.38%에 그쳤다.
이처럼 낮은 전환율의 배경에는 매우 까다로운 전환 요건이 자리하고 있다. E-7은 한국 1인당 국민총소독(GNI)의 80%, F-2는 100% 등의 소득 기준을 맞춰야 한다. 한국 GNI가 가파르게 오른 데다, 최근 환율까지 폭등하면서 기준 맞추기가 더 까다로워진 상황이다. 법무부가 공시한 한국 GNI는 이달 기준 4,405만1000원이다. 박사 학위 취득 후 대학에서 연구를 이어가거나, 공공 분야에 계약직으로 취업하는 경우에는 소득 기준부터 탈락하기 십상이라는 불만이 쏟아지는 배경이다.
채용 수요 증가세, 정보 부족·행정적 제약에 발목
외국인 유학생들의 탈(脫)한국은 이공계 인력난과 맞물려 더 뼈아프게 다가온다. 첨단기술 분야는 전공자를 크게 늘리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육성에도 오랜 시간이 필요해 고질적인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이 때문에 산업계에서는 국내에서 유학 중인 외국인의 정착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국내 유학 외국인은 연구역량은 물론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 또한 높아 기업의 채용 수요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가 국내 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외국인 이공계 석·박사 인재에 대한 기업 수요를 조사, 분석한 결과 약 24%(73개) 기업이 외국인 인력을 고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기업들의 평균 외국인 채용 수는 2명으로, 학력별로는 학사 1.1명, 석사 0.6명, 박사 0.3명이다. 이중 국내 유학생 출신 외국인은 35% 수준인 0.7명이다.
외국인 연구인력의 업무 배치는 연구개발직이 86%로 가장 많았고, 이어 영업 및 판매(22%), 현지 파견(19%) 등이 뒤를 이었다. 이들 기업이 외국인 유학생을 R&D에 활용하는 이유(복수 응답 가능)로는 내국인 연구인력 부족(43%), 해외시장 진출 업무에 활용(43%), 국내 인력 대비 전문성 및 능력 우수(33%) 등을 꼽았다.
반면 외국인 연구인력을 채용하지 않는 기업의 43%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정보 부족 때문에 채용을 하지않고 있다고 답했다. 이 외에도 내국인 연구인력으로 충분하다는 응답(17%)과 한국어 의사소통의 어려움(15%), 행정적 비용 및 제약(9%) 등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면서도 60%의 기업이 향후 외국인 연구인력을 채용할 계획이 있다는 개방적 입장을 보였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재계의 지적이다. 조사 대상기업의 69%는 외국인 연구인력을 현재보다 확대해야 한다면서 외국인 연구인력 인재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서비스 제공(32%)과 채용 보조금 지원(26%), 고용비자 발급조건과 절차 대폭 완화(20%) 등 정부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답했다.
김이환 UST 총장은 “국내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 유학생은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도와 높은 수준의 연구역량을 동시에 갖춘 고급 인력”이라면서 “이런 인재들이 국내 과학기술계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졸업 후 정착 등에 산·학·연·관이 뜻을 모아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사 인력의 하향 취업, 구조조정 신호?
반대로 국내 이공계 대학원이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분석 또한 제기돼 눈길을 끈다.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지난 1월 발표한 ‘이공계 대학원 혁신 방안’ 보고서에서 “국내 이공계 대학원은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양자기술, 바이오 등 첨단 기술 개발에 필요한 수월성을 확보하기가 전혀 불가능한 상태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STEPI는 박사 인력 공급이 과잉이라는 진단을 내놨다. “이공계 박사 배출 규모 대비 일자리 숫자는 1990년대 2.6배에 달했으나, 2000년대 이후 박사 배출은 5배 가까이 늘었음에도 일자리는 거의 늘지 않았다”고 짚으며 “고교 성적 우수 학생의 의학계열 선호와 이공계 기피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이공계 박사의 수급 불일치로 인한 노동시장 악화와 취업률 하락에 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박사 과잉 공급이 대학 내 열악한 처지의 포닥(박사후 연구원) 인력 증가로 이어져 박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대로 이어진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우수한 학부생들의 대학원 진학 기피로 연결될 뿐 아니라, 박사 인력의 장기적인 하향 취업을 유발해 연쇄적으로 석사와 학사 인력 시장에도 영향을 주는 악순환을 앞당긴다는 설명이다.
이 때문에 보고서는 대학원의 상황에 맞춰 석사 과정과 박사 과정을 특성화해 분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방 대학원이나 규모가 작은 대학원은 석사과정 중심으로 운영하면서 지역 산업과 기업 수요에 부응한 R&D에 집중하고, 박사 중심 대학원은 세계적 수준을 지향하는 연구중심 대학원과 기술 분야별 특화 대학원으로 나눠야 한다는 주장이다.
STEPI는 학령인구 감소 추이나 국내 고등교육의 규모 등으로 볼 때 연구중심 대학 숫자는 20~30개 선이 적당하다고 봤다. 보고서는 “교수와 석·박사 대학원생, 기타 지원인력으로 구성된 교수 연구실을 기본으로 한 현재 대학 R&D 체제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미래 성장 동력 확보라는 국가 현안 해결을 위해 이공계 대학원이 직면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