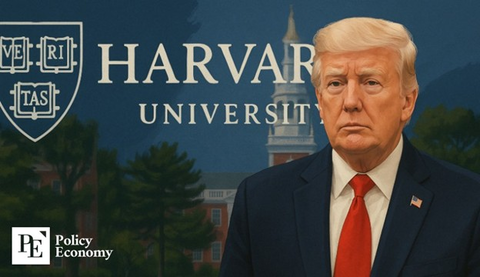입력
수정
외곽으로 갈수록 대출 의존도↑
동일 생활권 랜드마크에 수요 집중
자산 양극화에 소비재 시장도 촉각

대출한도를 옥죄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시행 등 부동산 규제가 서울 외곽 지역 아파트 거래량 및 가격 하락세를 부채질한 모습이다. 심지어 같은 생활권을 공유하는 아파트 사이에서도 가격 차이가 크게 벌어지면서 시장 양극화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이는 모든 시장에서 발생한 공통적 현상으로, 경기 불황에 접어들며 그 강도와 속도를 높이는 양상이다.
광진구 등 서울 외곽 아파트 거래량 급감
27일 서울부동산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총 5만5,613건으로 집계되며 전년(3만5,619건) 대비 56.1% 증가했다. 이 같은 거래량은 주로 상반기에 집중됐다. 아파트 공급 부족 우려와 금리 인하 기대감, 주택담보대출 금리 하락, 매매·전세 가격 상승, 신축 아파트 선호 현상 등이 맞물리면서 매수 심리에 불이 붙은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작년 9월 1일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으로 시장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스트레스 DSR은 대출 상환 능력을 심사할 때 가산금리를 더해 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제도다. 현재 수도권은 1.25%, 지방은 0.75%의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된다. 여기에 은행권 가계대출 총량까지 제한되면서 대출 문턱은 한층 높아졌다.
지난해 5월부터 8월까지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2만8,933건이다. 특히 7월에는 9,216건이 거래되며 4년 만에 월간 최대 거래량을 기록했다. 하지만 9월부터 12월까지 거래량은 1만2,205건으로 직전 넉 달과 비교해 58% 쪼그라들었다. 광진구가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 이 기간 광진구 소재 아파트 매매는 772건에서 246건으로 68.1% 줄었다. 서울 강북권 외곽인 노도강(노원·도봉·강북) 역시 50% 안팎의 거래량 감소를 맞았다. 노원구와 강북구는 각각 52.6%, 50.7% 줄었으며, 도봉구는 47% 감소를 나타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서울 외곽 지역의 거래 절벽이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강남 등 인기 지역으로 갈아타려는 주택 수요는 대출 규제에도 일정 규모가 유지되지만, 소위 ‘영끌족’ 유입이 많은 비인기 지역의 경우 규제 영향에 더 크게 노출된다는 설명이다. 서진형 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은 “초고가 아파트 밀집 지역은 자산이 풍부한 수요자가 대부분이라 규제 영향이 적다”며 “서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은 규제 여파가 보다 뚜렷하게 나타나는 편”이라고 분석했다.

강남 신고가 행진할 때 노·도·강은 ‘한파’
이러한 양극화는 직접적인 수치로도 확인된다. KB국민은행의 월간 주택 시계열에 의하면 지난 1월 기준 서울 지역 아파트값 5분위 배율은 5.6배를 기록했다. 5분위 배율은 주택 가격 상위 20%(5분위) 평균을 하위 20%(1분위) 평균으로 나눈 값으로, 상위 주택과 하위 주택 간 가격 차이를 나타내는 지표다. 다시 말해 상위 주택 1채로 하위 주택 5.6채를 구입할 수 있다는 의미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등 서울 상급지 아파트와 금천·노원 등 외곽 지역 아파트 간 가격을 비교하면, 이 같은 격차는 더욱 확연히 드러난다.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151㎡)는 지난해 11월 52억4,000만원에 거래되며 전고가를 뛰어넘었고, 비슷한 시기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원베일리(133㎡)는 106억원에 새 주인을 만나며 신고가를 새로 썼다. 반면 외곽 지역은 갈수록 하방 압력이 강해지는 분위기다. 노원구 월계동 현대아파트(84㎡)는 지난 1월 6억원에 거래되면서 지난해 9월 동일 면적 주택(8억1,700만원)보다 2억원 이상 하락했다.
심지어 같은 생활권을 공유하는 인근 단지에서도 가격 양극화는 심심찮게 포착된다. 일례로 성동구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로 꼽히는 서울숲트리마제(84㎡)는 지난해 11월 45억원(35층)에 새 주인을 만났다. 그러나 인근에 위치한 강변동양(84㎡)은 불과 한 달 뒤인 지난해 12월 29억원(12층)에 거래됐다. 두 아파트 사이 거리가 150m 남짓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16억원의 가격 차이는 더 크게 와닿는다.
이처럼 인접한 단지의 가격 차이가 벌어지는 가장 큰 원인은 선도 아파트(랜드마크)에 수요가 집중되기 때문이다. 상위 10%보다 상위 1%의 소득과 자산이 더 빠르게 늘면서 해당 지역에서 가장 좋은 아파트로 몰리는 것이다. 심형석 우대빵연구소 소장은 “소위 ‘대장 아파트’로 수요가 집중되면, 부동산 시장 상승기에도 여타 아파트들은 가격 상승의 수혜를 누리기 어렵다”며 “주택 수요자들의 올바른 판단이 더 많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VIP 마케팅에 힘주는 기업들
재화가 거래되는 모든 시장에서 ‘고급화’가 주요 전략으로 주목받는 이유도 이와 무관치 않다. 부동산 양극화로 대변되는 자산 양극화는 소비 패턴의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소비자 대다수가 불황에 직면한 상황에서는 특정 기업의 매출에서 VIP 고객이나 부유층 고객이 차지하는 비중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유통업계에서는 국내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쿠팡이 가장 먼저 프리미엄 시장을 공략하고 나섰다. 쿠팡은 최근 식료품 분야에 ‘프리미엄 프레시’ 카테고리를 새로 열었으며, 이에 앞선 지난해 12월에는 세계 최대 명품 패션 플랫폼 파페치(FARFETCH)를 5억 달러(약 6,500억원)에 인수하며 명품 시장 공략을 본격화했다. 향후 뷰티, 공산품, 가전 등 전 분야에 걸쳐 프리미엄 라인을 구축하겠다는 게 쿠팡의 구상이다.
여행업계에도 고급화 바람이 불고 있다. 모두투어는 새로운 패키지여행 브랜드 하이클래스(High Class)를 론칭했다. 단순 고가 여행을 넘어 특별하고 희소성 있는 경험을 통해 소비자 만족도를 높인다는 취지다. 럭셔리 여행 상품의 경우, 참여자가 소수여도 1인당 상품 가격이 수천만원에 달해 불황에도 이익을 내는 ‘무풍지대’로 불린다.
그러나 대부분 소비자는 초저가 소비와 합리적 소비를 지향하는 ‘요노(YONO·You Only Need One)’ 열풍에 탑승하는 분위기다.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의미의 요노는 과감한 지출에 거리낌이 없는 ‘욜로(YOLO·You Only Live Once)’의 시대가 가고 새롭게 부상한 트렌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올해 시장 화두로 ‘생존’을 꼽으며 “경기침체와 불확실성 고조에 생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진 만큼 기업들은 새로운 수익모델을 찾아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