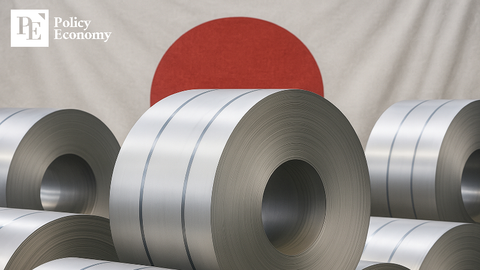입력
수정
물동량 감소·운임 하방 압력에 항해 보류 노선별 운임 요동, 세계 물류업계 비상 미중 무역분쟁 여파에 혼조세 지속 전망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조치가 본격화되면서 글로벌 해운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아시아-미국 간 태평양 항로를 중심으로 임시결항(Blank Sailings)이 급증하는가 하면, 노선별 운임이 큰 변동성을 보이는 등 물류업계에 ‘관세 쓰나미’가 들이닥친 양상이다.
아시아-북미 노선 선사들, 줄줄이 항해 취소
24일 덴마크 해운 분석기관 씨인텔리전스(Sea-Intelligence)에 따르면 최근 아시아-북미 항로에서 임시결항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임시결항은 수요나 운임이 급감할 때 선사들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하는 공급 조절책이다.
선사들은 올해 16~19주차(4월 14일~5월 4일)에 공급량이 36만7,804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지난달 중순에 예측했던 수치(2만6,484TEU)보다 12배 이상 많다. 씨인텔리전스는 관세 불확실성이 이어지자 해운사와 화주가 공급망 조정에 나서면서 공급이 줄었다고 분석했다. 미국은 중국산 수입품에 145%의 관세를, 중국은 미국산 수입품에 125%의 관세를 매기고 있다.
관세 전쟁 등의 영향으로 미국으로 가는 해상 물동량은 최근 둔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미국의 항만 화물 물동량은 1,438만8,444톤(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0.4% 늘어나는 데 그쳤다. 지난해 3월 미국 항만 화물 물동량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2.1% 증가했다. 스티븐 라마르 미국 의류·신발 협회(AAFA) 대표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높은 관세와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가 심각한 공급망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했다. 해상 운송업체 OL USA 앨런 베어 대표도 “중국 관련 사업은 거의 모두 중단된 상태”라고 말했다.
아시아-북미 노선 비중이 큰 HMM 역시 공급 조절에 나서고 있다. 지난달 계선율(전체 컨테이너선 가운데 운항하지 않는 선박의 비율)은 0.7%로 전월 대비 0.1%포인트 늘었다. HMM은 지난해 매출 11조7,000억원 가운데 36.5%(4조2,652억원)가 미주 노선에서 발생했다. 한 해운 업계 관계자는 “HMM은 수요에 맞춰 탄력적으로 선대를 운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사이익 유럽 노선은 껑충
관세 폭풍은 노선별 운임에도 변동성을 가져오고 있다. 미국의 상호관세가 발효된 이후 아시아-북미 노선 운임은 물동량 감소로 하락세로 전환된 반면, 유럽 노선 해상 운임은 상승세로 반전됐다. 관세폭탄이 본격화하자 미국으로 수출하려던 화물이 대거 유럽으로 방향을 틀면서 운임이 오른 것이다. 한 해운사 임원은 “유럽 운임의 반등은 최근 들어 해당 노선 운임이 크게 하락해 회복세를 보이는 측면도 있지만, 동아시아 지역에서 생산한 제품들이 미국에서 수요가 제한되면서 유럽이나 타지역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도 보인다”고 설명했다.
일본, 동남아시아 노선 운임 등도 관세 영향권에 들면서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중국만 상호관세를 얻어맞으면서 당분간 동남아 등 다른 아시아 지역으로 ‘우회수출’하려는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국해양진흥공사 관계자는 “베트남, 태국 등 다른 아시아 국가를 우회해 현지에서 포장, 조립한 뒤 미국으로 수출하는 형태가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한 주 새 동남아 노선 운임은 445에서 448로 0.7%로 올랐다.

해운 시황 침체기 재진입 가능성
다만 미국의 대중국 관세 폭탄 조치가 장기화할 경우 글로벌 물동량 위축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직후 글로벌 공급망 붕괴를 경험한 해운사들은 그간 상품 수요의 급증에 따른 컨테이너 해상물동량 수요 급증에 대응해 지속적으로 컨테이너선 발주에 나섰다. 이로 인해 매년 약 7%씩 선복량이 증가했다.
그러나 컨테이너 화물의 해상수송 수요 증가는 매년 약 3%에 그치다 보니 지금도 이미 선복 과잉 상태다. 현재 전 세계 컨테이너 선대는 약 3,110만TEU며, 공급 초과 상태인데도 발주 잔량은 무려 896만TEU에 달한다. 이를 합산하면 4,000만TEU가 되는 만큼 매년 순차적으로 컨테이너선이 해운사로 인도되면 완전 공급 초과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이에 선사들은 이미 SCFI(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가 급락했던 2023년부터 운임 하락을 막기 위해 운항 10% 취소, 임시결항, 저속운항, GRI(운임일괄인상) 시행 등 다양한 상응 조치를 해 왔지만 이 같은 해운사의 조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가격을 결정하는 '수요·공급의 원칙'에 어긋나는 만큼 그 지속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특히 벌크선은 미국 상호관세 조치로 인해 전 세계 벌크화물의 최대 수입국인 중국의 곡물·에너지 수입 제한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구교훈 한국국제물류사협회장은 "글로벌 벌크화물 운송이 급감할 것으로 우려되며 벌크선의 공급과잉으로 인해 향후 BDI(건화물운임지수) 하락도 예상된다"고 전했다. 컨테이너와 벌크화물 모두 수요 부족과 공급 초과로 인해 시황이 침체기로 접어들 공산이 매우 크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