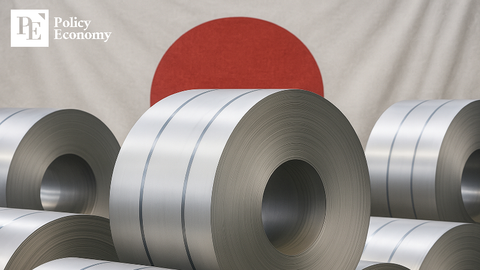입력
수정
2009년 UAE 수주 이후 16년 만의 체코 수주 한수원, 2016년부터 현지진출 위해 공 들여 탈원전 불확실성 속에서도 수출 노력 지속

한국·미국·프랑스·중국·러시아 등 5개국이 전 세계 원자력 발전 용량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며 글로벌 원전 시장을 이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성공과 체코 원전 수주 등을 바탕으로 글로벌 원전 공급국 자리를 크게 굳히게 됐다.
한국, 美·佛·中·러와 함께 전 세계 원전 용량 70% 장악
12일(현지시각)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전 세계 31개국에서 416개의 원자로가 가동되고 있으며, 총 순 발전 용량은 376기가와트(GW)에 이른다. 이 가운데 상위 5개국이 전체 용량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1위는 97GW 용량의 94개 원자로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이다. 1950년대 후반 펜실베이니아의 시핑포트 원자력 발전소로 상업용 원자력을 개척한 미국은 여전히 세계 선두 자리를 지키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782기가와트시(GWh)를 생산해 국가 전력 공급의 19%, 2023년 전 세계 원자력 생산량의 30%를 담당했다. 특히 미국 원자로들은 지난해 용량 계수가 92%에 이르러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효율 수준을 보였다.
프랑스는 63GW 용량의 57개 원자로로 2위를 차지했다. 프랑스의 원자력 에너지는 2023년 국가 전력의 거의 65%를 공급했는데, 이는 1970년대 석유 위기에 대응해 1970년에서 1990년 사이 빠른 원자로 건설의 결과다. 중국은 1991년 이후 57개의 원자로가 시운전돼 총 55GW 용량으로 3위를 기록했다. 4위를 차지한 러시아는 27GW 용량의 36개 원자로를 운영하고 있으며 4개를 더 건설하고 있다. 국영 로사톰(Rosatom)은 기존 RBMK 설계를 VVER-1000과 VVER-1200 장치로 바꾸는 한편 원자력 기술의 글로벌 수출 시장을 이끌고 있다.
한국은 26개의 원자로를 운영하며 26GW 용량으로 세계 5위를 기록했다. 원자로당 평균 용량이 1GW로 효율성 높은 운영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국은 수입 화석 연료 의존도를 줄이는 데 중점을 둔 에너지 정책에 따라 현재 2개 원자로를 더 건설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한국이 UAE 바라카 원전의 성공적인 건설과 운영을 바탕으로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경쟁력을 입증했다는 평이 우세하다. 특히 APR-1400 기술의 안전성과 경제성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으면서 추가 수주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는 분석이다.

기술자립에서 수출 집중체제로 전환
실제 한국수력원자력은 UAE 바라카 발전소 건설에 이어 체코 두코바니 발전소 확장 계약을 맺는 등 명실공히 주요 국제 공급업체로 자리 잡았다. 앞서 한수원은 2016년 정부의 공공기관 기능 개편에 따라 모회사인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원전수출 총괄 기능을 부여받았다. K-원전 수출 가능성이 있는 38개국 중 체코를 포함한 25개국에 대한 ‘영업’ 역할을 새로이 부여받은 것이다.
체코는 그중에서도 주요한 수출 후보로 지목됐다. 이미 1985년 이후 6기의 원전을 운영하며 주요한 전력원으로 활용해 왔고, 4년 전인 2012년에 2025년까지 2기의 신규 원전을 추가로 도입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참이었다. 한국은 체코 측에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쟁사 대비 더 낮은 비용에, 계획한 대로 건설하겠다는, 이른바 ‘온 타임 온 버짓(on time, on budget)’이다. 그 결과 지난 5월 양국은 본계약을 체결했다. 16년 만의 해외 원전 사업 쾌거였다.
이를 두고 박상덕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수석연구위원은 국내 원전 생태계의 신속한 회복과 글로벌 공급망 구축의 초석을 놨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짚었다. 지난 2000년 이후 우리나라는 해외 수출을 포함해 16기를 건설하며 원전 생태계를 구축했지만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원전 생태계가 일시에 무너졌다고 꼬집었다.
박 연구위원은 “원자력산업협회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6년 5조5,034억원 수준이던 원전 업계 전체매출은 2020년 4조573억원으로 4년새 26% 줄었다”며 “같은 기간 수출은 1억2,641만 달러(약 1,742억원)에서 3,372만 달러(약 465억원)로 73% 급감했으며 업계 인력도 2만2,000명에서 1만9,000명으로 감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원전 생태계 회복을 위해 정부는 산업통상자워부와 중소벤처기업부를 통해 생태계 재건 프로그램을 진행해 신한울3·4호기 건설설계, 원전업계 지원, 원자력R&D 등을 지원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섰다고 설명했다.
그는 체코 원전건설 수주가 우리나라 원전건설 기술의 우수성이 인정받은 결과라는 점도 강조했다. 실제로 안전성과 관련해선 APR-1400을 개발해 수출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안전성을 높여 APR+를 개발했으며, 유럽형 APR-1000을 개발해 유럽사업자협회 인증까지 받아 안전성 측면에서 유럽 진출을 위한 선제적 조치를 취했다. 나아가 박 연구위원은 원전수출 강국 달성을 위해서 △정책의 일관성 △한미 원자력 동맹 강화 △원전수출체제 개편 △미래기술의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금까지의 기술자립 체제에서 벗어나 수출 집중체제로 바꿔야 하며 SMR, 부유식 원전, 선박 추진용 원전, 우주 추진용까지 미래 원자력기술을 확보해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는 분석이다.
다음 후보군은 사우디·튀르키예·필리핀 등
현재 한전·한수원은 다음 수주를 위해 사우디아라비아와 튀르키예, 베트남, 아프리카 등지에서 원전 세일즈를 진행 중이다. 세계원자력협회(WNA)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자국 원전은 자체 건설하는 중국·러시아를 뺀 나머지 국가의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은 186기다. 이를 원전 수출 능력이 있는 미국과 프랑스, 한국과 신흥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업이 나눠 추진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업계는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비공개 합의(특허권 분쟁 해결)가 K-원전의 다음 진출 지역을 결정하게 될 키로 보고 있다. 한전·한수원은 올 1월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재권 분쟁 해소 이후 스웨덴, 슬로베니아, 폴란드 등지의 원전 사업을 철수했다. 유럽 지역 신규 원전 입찰은 상당 부분 웨스팅하우스에 양보했다고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업계의 눈은 자연스레 중동,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추진하는 신규 사업에 쏠린다.
UAE와 체코 등 기수주 국가에서 새로이 추진하는 원전 사업을 수주할 가능성도 있다. UAE는 한국이 지은 바라카 1~4호기에서 자국에 필요한 전력 4분의 1을 충당하고 있으며, 이에 만족해 추가 원전 건설도 검토 중으로 알려졌다. 체코 역시 당장은 한수원에 2기 건설을 맡기지만, 처음부터 최대 4기 건설을 추진했고 2기 추가 계획은 유효하다. 26조원 규모의 사업이 52조원까지 커질 여지가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