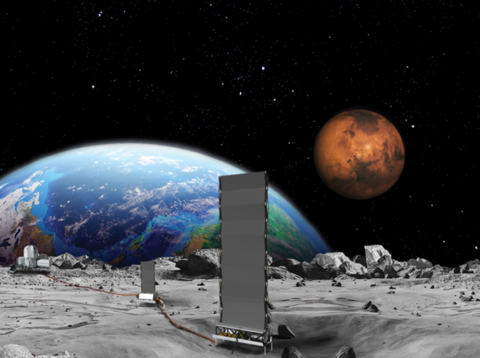입력
수정
미국인들, 틱톡 대체재로 ‘레드노트’ 선택 미중 ‘문화 교류의 장’으로 변모 플랫폼 분리 없이 ‘AI 활용 검열’ 검토해야
[동아시아포럼] 섹션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대학(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에 대한 연구·분석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 이코노미(Policy Economy)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미국에서 틱톡(TikTok) 사용이 금지되며 중국 본토의 라이프스타일 앱인 레드노트(RedNote)가 수백만 미국인들의 대체재가 됐다. 지난 1월 단 이틀 만에 백만 명의 신규 가입자가 레드노트로 몰리며 국경을 넘은 돌풍을 일으킨 것이다. 중국 밖에서는 거의 아는 사람이 없던 레드노트는 미국인과 중국인 간 문화 교류의 장으로 빠르게 변했다. 하지만 지금부터 문제는 중국 당국의 전통적인 검열 방식이다. 그간의 방식처럼 레드노트도 국내용과 해외용으로 분리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 것인지 초미의 관심사다.

미국인들, 틱톡 금지 후 ‘레드노트’로 몰려
레드노트는 틱톡 금지 조치 이후 갑작스럽게 전 세계적 주목의 대상이 됐다. 소셜 네트워킹과 이커머스 기능으로 일간 활성 사용자가 340만 명에 이르렀는데 대다수가 미국인들이다. ‘틱톡 피난민’ 등의 해시태그를 달고 밈(meme)이나 패션 관련 조언을 주고받으며 미중 교류의 장이 된 것이다. 양국 간 정치적 갈등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일이다.
심지어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이 취임하며 틱톡 금지 조치가 풀렸는데도 다수의 이용자가 그대로 머물고 있다. 전문가들이 개인정보 보호 및 국가 안보 위험을 경고하고 있지만, 일부 이용자들은 실리콘 밸리도 개인정보 침해와 무관하지 않다며 ‘디지털 냉전’(digital Cold War)이니 하는 말로 위기감을 부추기지 말라고 비판하고 있다. 레드노트가 새로운 문화 교류의 장으로 떠오르며 보다 개방적인 플랫폼을 찾는 이용자들의 방문도 잇따르고 있다.
중국 플랫폼 관리 방식, ‘하나의 앱, 두 개의 시스템’
중국에서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X 등이 모두 사용 금지다. 위챗이나 더우인(Douyin, 틱톡의 중국 버전), 웨이신(Weixin, 위챗의 중국 버전) 등 중국 소셜 미디어도 모두 중국인과 외국인 간 대규모 접촉을 금지하는 검열하에서 운영되고 있다. 글로벌 인기 플랫폼마저 국내용과 해외용을 구분해 운영하는 ‘디지털 분리’ 정책은 국내 검열을 유지하면서 해외 영향력은 확대하려는 목표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레드노트의 갑작스러운 부상은 중국 당국에 고민거리다. 하루아침에 미국과 중국 사용자가 함께 모여 콘텐츠를 공유하는 플랫폼이 생겨 버린 것이다. 문화 교류의 장이라고 하지만 중국 본토와 홍콩과의 관계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들이 불거질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다.
지금까지 중국 정부의 소셜 미디어 규제는 플랫폼을 두 가지 버전으로 나누는 것이었다. 이를 중국 정부의 검열을 준수하는 국내용과 해외 이용자들을 위한 해외용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앱, 두 개의 시스템’(one app, two systems)이라고 명명한다. 대표적인 앱이 틱톡-더우인, 위챗-웨이신인데 각자의 고객 필요에 맞춰 잘 적응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중국 정부 ‘세계화 수호자’ 슬로건 “부담”
그렇다면 레드노트도 해외용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이 맞지만 상황이 달라졌다. 중국 정부가 세계화의 수호자를 자처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궈자쿤(Guo Jiakun)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중국은 글로벌에서의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해 문화적 교류 활성화를 지원한다’고 선포한 마당에 레드노트를 함부로 분리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하나의 앱, 두 개의 시스템’ 정책의 대안으로 떠오르는 것이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선별적 규제다. 사용자의 언어와 IP 주소 등을 기준으로 AI가 검열 기능을 담당한다면 플랫폼을 쪼개지 않고도 중국 내부와 글로벌 이용자들을 통합 운영할 수 있다. 중국 정치권에서도 이미 해당 논의가 진행 중이다.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AI의 콘텐츠 검열 기능을 확대하는 방안이 지난 1월 정치 회의에서 제안된 바 있다.
‘AI 활용한 검열’, 대안으로 검토해야
여기에 필요하다면 해외 이용자들의 ‘복사 및 붙여넣기’(copy-and-paste)나 번역 기능 사용을 제한해 민감한 콘텐츠가 확산하는 일을 방지할 수도 있다. 플랫폼을 분리하지 않고 정보 흐름을 관리할 수 있는 길은 분명히 있다.
AI를 활용한 검열은 콘텐츠에 대한 통제를 유지하며 소프트 파워(soft power, 강압에 의하지 않은 영향력)를 키운다는 중국 정부의 목표와도 일치한다. 이를 위해 중국은 알고리즘 관리(algorithmic governance) 역량에 투자해 모든 콘텐츠가 ‘핵심적 사회주의 가치’(core socialist values)와 일치하도록 관리하는 AI 시스템을 개발한 바 있다.
레드노트는 해당 시스템을 시험하고 개선할 절호의 기회며 성공할 경우 다른 플랫폼에도 적용해 중국의 디지털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AI가 티 나지 않게 콘텐츠를 관리한다면 중국 정부는 체제 안정을 유지하면서 세계화의 수호자 이미지를 키워나갈 수 있는 것이다.
한편 레드노트의 급격한 부상은 정치적 갈등과 무관하게 최상의 경험을 제공하는 플랫폼에 이용자가 몰린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입증한다. 아무리 지정학적 긴장이 심화한다 해도 국가 간 정보 흐름과 디지털 플랫폼의 대화 기능을 막을 수는 없다. 레드노트 역시 세계인을 연결하는 장으로 만드는 것이 지속 가능하며 바람직한 정책이다.
원문의 저자는 마샹유(Xiangyu Ma) 호주 국립대학교(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박사과정생 외 1명입니다. 영어 원문 기사는 RedNote walks China’s digital tightrope | EAST ASIA FORUM에 게재돼 있습니다.